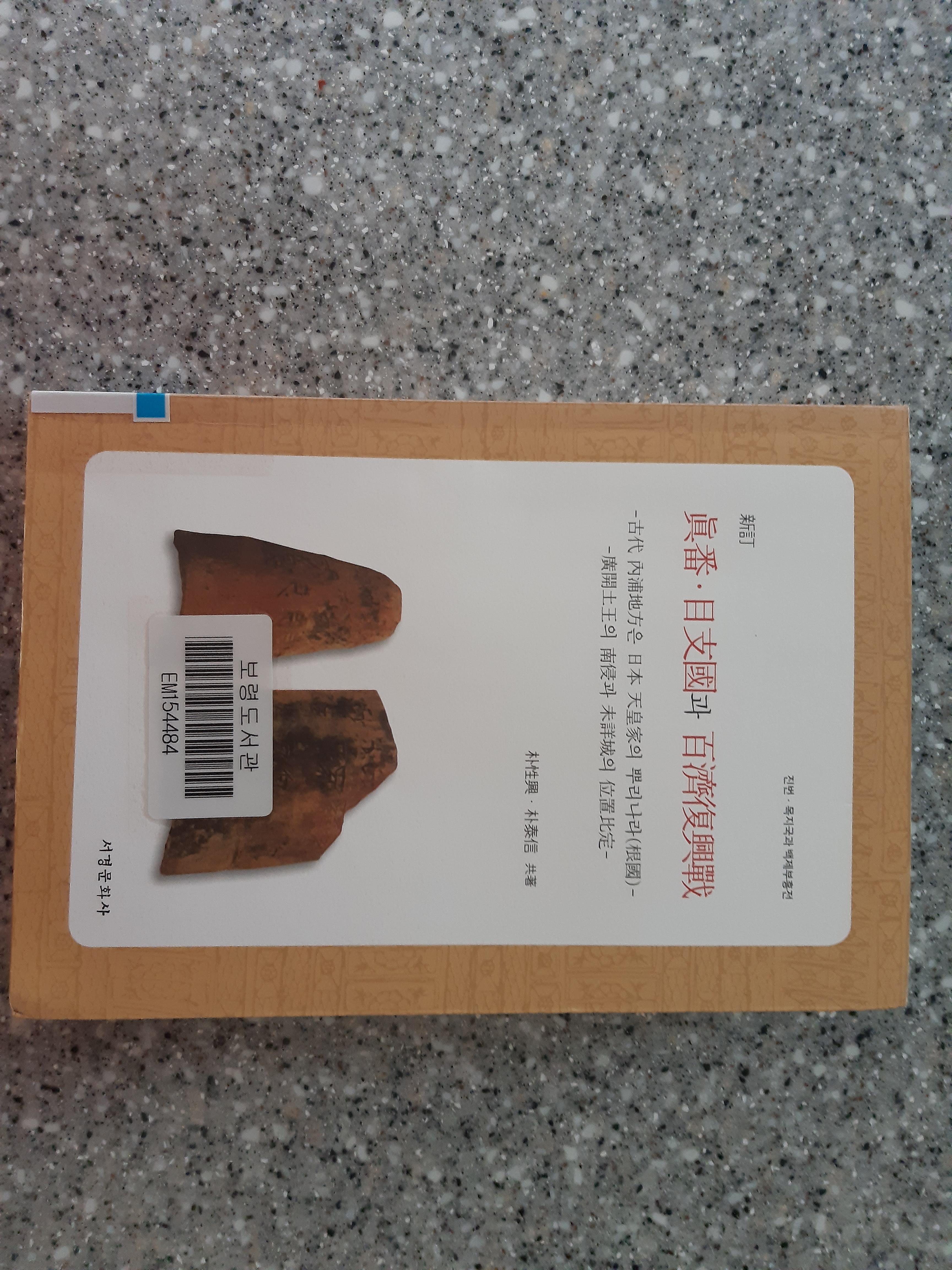1. 들어가며 몇 해전에 봉수산의 임존성(제29편; 백제부흥군의 정기 어린 임존성, 2019.4.1)을 답사하였으나, 오서산의 '도독의 성'이 백제부흥운동의 일환으로 축성되었을 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자료를 찾아 보았다. 백제가 멸망하고 국권을 회복하고자 백제의 유민과 왜와 연합한 부흥군과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치열한 전투를 치뤘던 주류성의 위치가 인접한 홍성의 학성산성이라는 설에 그곳을 답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두루미城 =두루성=鶴城 =周留城'이라는 논리에 어느정도 일치 하는지 궁금하기도 해 발길을 재촉 하였다. 학성의 위치는 사운고택 뒷편 산으로 지방도 619번과 지방도 96번이 교차하는 장곡면 산성리에 위치한다. 지리적으로 부여나 공주에서 예산이나 당진쪽으로 지나가는 조선시대의 '금정도'가 중..